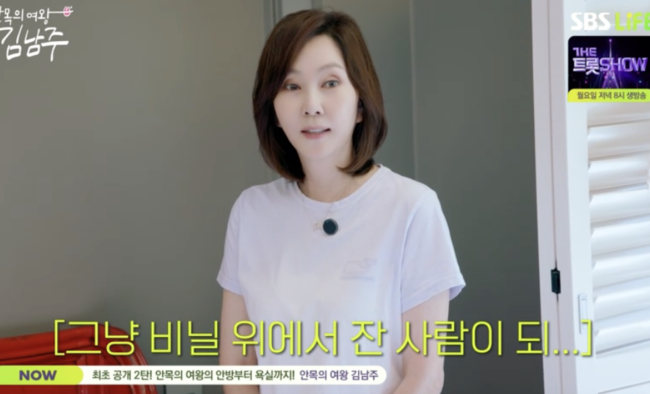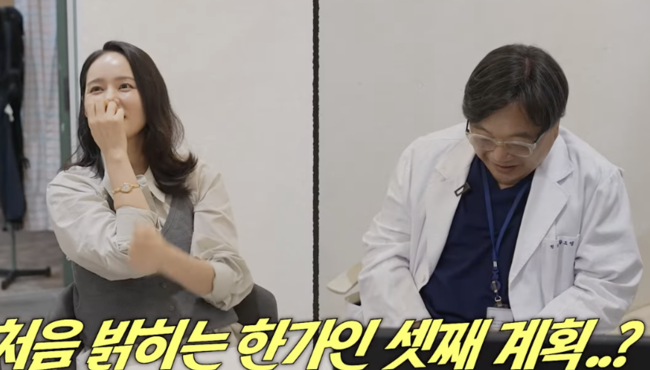서울 관악구에서 다세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 A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빠르면 올 가을부터 빌라 전세 매물이 줄줄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다세대주택 밀집 구간. (사진=연합뉴스)
HF가 지난달 28일, 유예기간 없이 이날부터 전세보증 요건을 공시가격의 126%로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그간 HF는 공시가격의 150%에 LTV 90%를 곱하는 방식(135%룰)을 적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이 막힌 경우에도 ‘마지막 피난처’ 역할을 해왔으나 이마저도 사라진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고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 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26%룰은 주택 공시가격에 140%를 곱한 뒤, 여기에 담보인정비율(LTV) 90%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보증 상한으로 두는 것을 말한다. 공시가격이 3억원인 주택이라면 보증 가능액은 3억 7800만원이 되는 식이다. 이 집에 이미 2억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고 세입자가 2억원 전세 계약을 원하면 합산액이 한도를 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보증 사각지대’로 꼽히던 비아파트 주택 시장에서는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혔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 세입자 구하기 막막…월세 전환·보증금 반환 ‘고민’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게 책정돼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기 쉽다. 건물 전체가 근저당으로 묶인 공동담보 구조라면 세대별 위험이 낮아도 건물 전체를 합산해 보기 때문에 보증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기도에서 다세대 주택을 임대하는 김 모 씨는 “유예기간도 없이 규제를 들이대 숨 쉴 틈이 없다”며 “보증이 막힌 이상 반전세로 돌리지 않으면 손해가 더 커진다”고 했다.

서울 공덕동 전경. (사진=이다원 기자)
임대인들의 위기감은 한층 크다. 신규 세입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막히고 결국 임차권등기 신청이나 경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4분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 2만 4191건 중 1만 8889건(78.1%)이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는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진다고 봤다.
관악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B씨는 “안 그래도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새 세입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길이 없다”며 “결국 임차권등기 신청이나 경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차단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아파트 시장이 단기간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 자금 순환 구조가 끊기면서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비아파트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