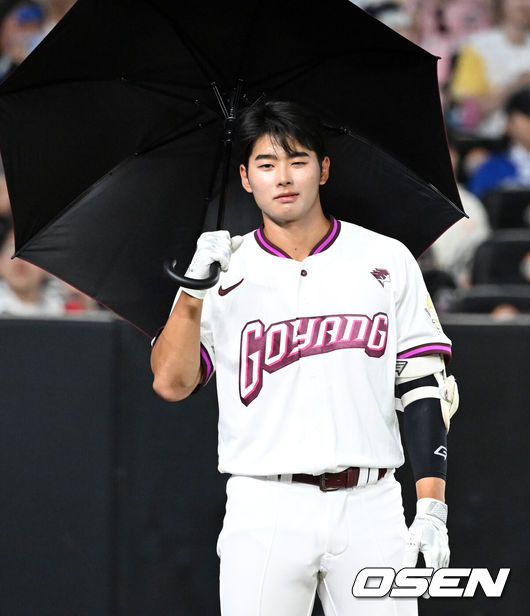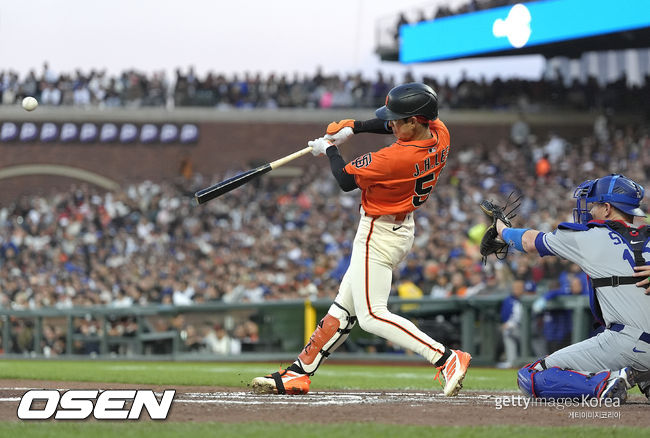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식당을 찾기 전 SNS에 식사 계획을 알리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긴 합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풀면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물가 상승만 유발된다는 비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당 상임위원장들과 모인 자리에서 우리나라 재정 여력을 걱정했고, 추가로 2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예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이번 추경과 쿠폰 발행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밖에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없을까요? 많이 있긴 한데, 저는 곧 발행될 국채 20조원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좀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 20조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 국채처럼 해외 수요자가 있다면 나가서 팔면 좋을 텐데, 아마도 국내 시장 참여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연기금, 은행 등 돈을 굴려야 하는 기관투자자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채권 발행 통계를 봐야 하는데, 이 자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채권정보센터 발행 통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최근 1년만 (2024년 7월 첫주 ~ 2025년 7월 첫주) 놓고 봤을 때 국채 발행액은 264조원이었습니다. 이중 184조원 정도를 상환했고, 약 80조원이 남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80조원은 우리 정부 빚으로 누적됩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첫주부터 2024년 7월 첫주에도 우리 국채의 순발행액은 65조원이었습니다. 그 전 해(2022년 7월 첫주 ~ 2023년 7월 첫주)는 86조원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그 전 문재인 정부 때도 수십조원의 빚 부담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순발행액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20조원 발행은 부담이 되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과 같은 추세로 국채를 발행한다면 100조원가량 국채 잔액이 더 순증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전체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볼까요. 2025년 7월 기준 국채 잔액은 1235조원입니다. 20조원이 새롭게 추가된다면 1.6%가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난 한 해(2024년 7월 첫째주~2025년 7월 첫째주) 전체 채권 발행 규모는 950조원 정도였는데, 이 중 국채 발행 규모가 267조원이었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20조원 정도는 충분히 희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환 규모를 늘리거나, 다른 목적의 국채 발행을 줄인다면 영향은 더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상환을 더 할 수 있었다면, 20조원 추가 발행까지 안갔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발행의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점증적으로 국채 20조원어치를 발행한다고 해도 공급량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국채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국채 금리가 기업어음(CP), 회사채, 대출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채금리 상승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과 가계대출 금리 부담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정부 재정의 확장 효과가 ‘금리 상승’이라는 벽을 만나 ‘상쇄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긴축효과’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는 대내외적으로 높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가 없다면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워낙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도 ‘국채 발행 이후 후과’에 대해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도 관점을 달리 봐야합니다. 만약 우리 정부의 ‘쌓이는 빚’이 ‘지나치게’ 걱정된다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정부의 빚 부담도 줄어드는 이유가 큽니다. (화폐 가치 하락 효과) 단적인 예로 2022년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신음하면서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일부 하락했다고 합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불가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잘 살피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는 최대한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