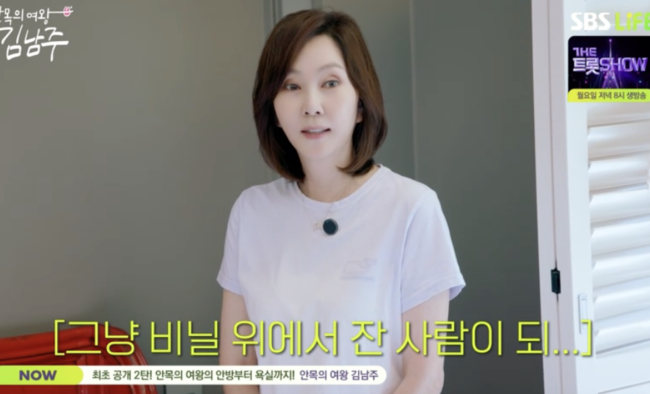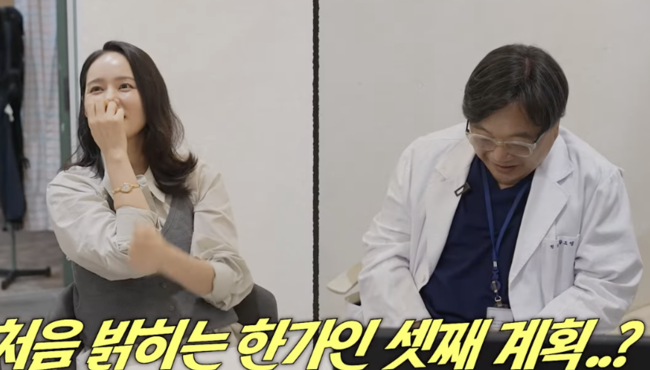(사진=이데일리 DB)
연구진은 “뉴질랜드 남자 럭비 선수들은 일반 인구에 비해 신경질환 발병 위험이 소폭에서 중간 정도까지 높다”고 밝혔다. 특히 선수 생활이 길고 경기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은 커졌으며, 70세 이후 발병 사례가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뉴질랜드 남성의 높은 수준의 럭비 참여는 일반 인구에 비해 신경퇴행성 질환 발병률이 소폭에서 중간 정도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결과는 축구·미식축구 등 다른 격한 스포츠에서 나온 연구와도 일치한다. 실제로 전직 선수들 가운데는 부검을 통해 반복적 머리 충격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성 외상성 뇌병증’(CTE)이 확인된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해 호주프로풋볼리그(AFL) 선수 아담 헌터가 43세에 세상을 떠난 뒤 CTE로 판명됐고, 뉴질랜드 올블랙스 전설 칼 헤이먼(45)은 조기 치매를 앓고 있다. 그는 머리 부상 등 선수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해 월드 럭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직 선수들 중 하나다.
미국에서는 2013년 내셔널 풋볼 리그(NFL)가 리그가 뇌진탕의 장기적인 위험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수천 명의 전직 선수들과 7억6500만달러 규모 합의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뉴질랜드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조사지만 여성과 아마추어 선수, 2000년 이후 활동한 선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월드럭비와 뉴질랜드 럭비재단의 지원을 받았으나 연구진은 “연구 과정의 독립성과 무결성은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마크 로빈슨 뉴질랜드 럭비 최고경영자(CEO)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럭비가 일부 선수와 그들의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인정한다”며 “그들의 경험은 선수 복지 개선과 경기 전반에 걸친 의미 있는 변화를 추진하는 우리의 작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