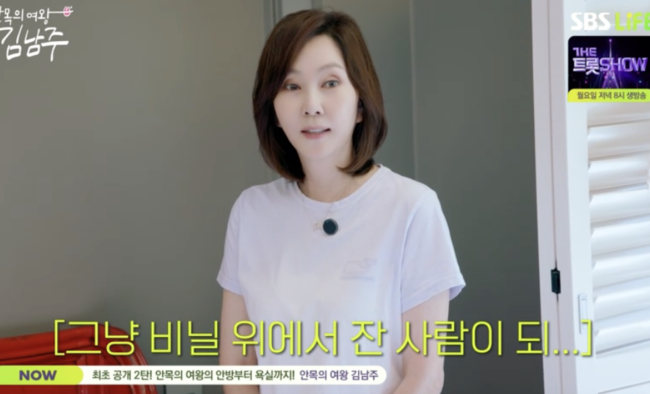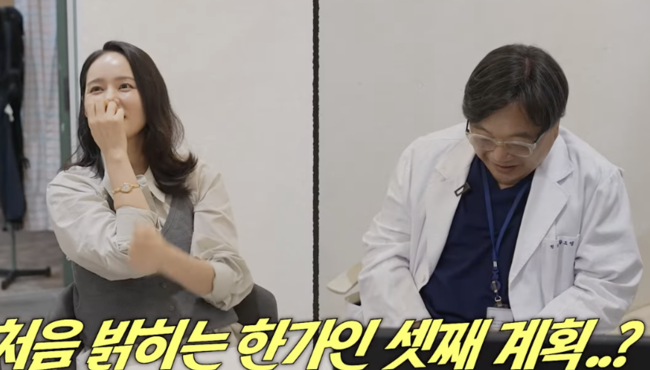(사진=AFP)
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2025년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에서 심의·결정된 최저임금을 집계한 결과, 전국 가중평균이 1121엔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1055엔)보다 66엔(6.3%)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이 아닌 각 도도부현별로 별도의 최저임금이 정해지며, 매년 8월 후생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지역별 기준(목표 또는 지침)을 제시한다.
당초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지역별 상승폭 63~64엔, 전국 평균 1118엔을 상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보고된 평균액이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후생성은 또 사상 처음으로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 모두에서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로 1226엔(약 1만 1523원), 가장 낮은 곳은 고치·미야자키·오키나와로 1023엔(약 9615원)으로 각각 보고됐다. 최고액 대비 최저액 비율은 83.4%로 11년 연속 개선됐다.
인상폭이 가장 큰 곳은 구마모토현(82엔)으로 정부 권고(64엔)보다 무려 18엔이나 높았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인상폭이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과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반영되며 지역 간 경쟁도 심화했다. 아키타의 경우 정부 권고보다 16엔 많은 80엔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확인한 이와테도 사흘 뒤 아키타와 동일한 1031엔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했다. 이와테의 인상폭 역시 정부 기준보다 15엔 높다.
다만 아키타·군마 등 일부 지역은 새 최저임금 적용 시점을 내년 3월로 미루기로 했다. 일반적으론 10월부터 적용하지만, 한 번에 임금이 크게 오를 경우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 소득 조절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에선 파트타임 근로자가 ‘103만엔의 벽’을 의식해 연소득 103만엔까지만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득이 103만엔을 초과하면 소득세가 부과돼 실질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말결산을 앞두고 10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이 도래하기 전에 전국 평균 시급 1500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기준치 초과 지역에 보조금 등 지원책을 예고했으며, 각 지방정부들도 적극적인 인상 유도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중소·영세기업이다. 일본에서 최저임금 수준만 받으며 일하는 사람은 약 660만명으로, 대다수가 중소·영세기업 소속이다. 이들 기업은 인건비 급등 및 이에 따른 순이익 감소로 경영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술력 좋은 중소기업도 인재 채용이나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다고 닛케이는 부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생산성 향상·자동화 등에 도움이 되는 설비나 장비 투자에 대해 지원금(보조금) 제공을 늘리고,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