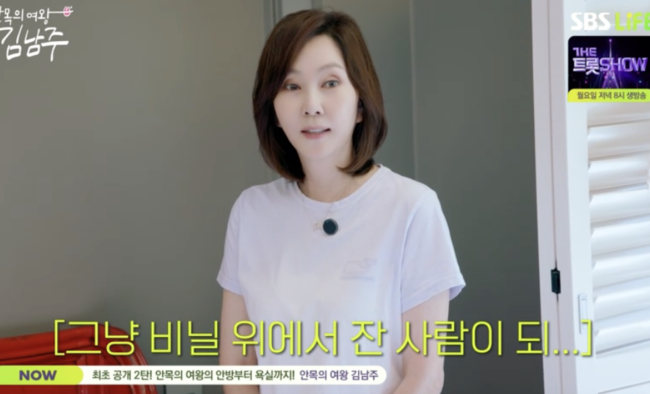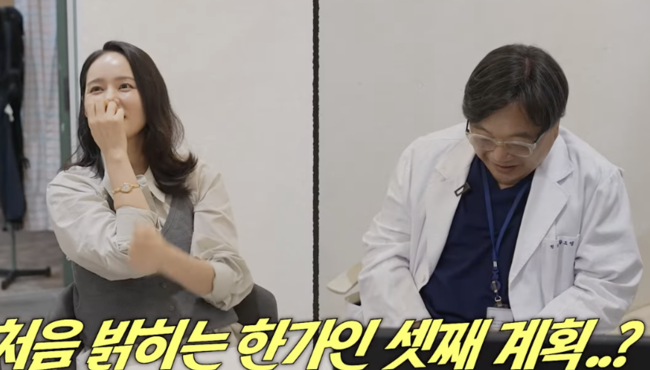일본 오사카부 다카츠키시에 위치한 다케이 긴지로의 가족묘. 다케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필리핀에 주둔했던 일본군 공병장교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사진=AFP)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시의 장례회사 ‘티아(TEAR)’는 최근 자사가 제휴한 안치시설에서 전혀 다른 시신이 화장되는 사건이 있었다. 사고는 지난 1월 발생했으나, 유족이 유품을 통해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한 뒤인 7월이 돼서야 드러났다.
당시 제휴업체 직원은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기던 중, 같은 성(姓)을 가진 다른 시신을 착각해 운구했다. 시신의 발목에는 명찰이 있었지만, 전체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인계 절차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화장을 마친 유품에서 본 적 없는 의류 등이 발견되면서 유족이 다른 사람의 시신임을 알아차렸다. 이후 무연고자의 시신이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돼 화장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티아는 유족에게 사과한 뒤 다시 화장을 진행했다.
티아는 올해 3월에도 사이타마현의 다른 장례식장에서 두 시신을 바꿔 출관하는 사고를 냈다. 이 역시 낯선 유품을 본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며 뒤늦게 드러났다. 이외에도 장례업체 ‘알파클럽 무사시노’가 운영하는 시설에선 2022년까지 총 3건의 시신 착오 사고가 있었다. 모두 명찰 확인 소홀 등 직원의 실수가 원인이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고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고령화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례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공익사단법인 ‘전일본묘원협회’의 요코타 마코토 수석연구원은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의 실수지만, 고령화에 따라 사망자 수가 늘고 장례 방식도 간소화되는 추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사망자 수는 약 157만 명으로 20년 전보다 1.6배 늘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이 수치가 2040년까지 166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화장 대기’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전통 장례 대신 간소한 ‘직접장’이 보편화됐다. 이로 인해 장례업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시신 수가 증가했고, 관리 부담도 커졌다.
티아가 직영하는 장례식장의 2024년 9월기 기준 장례 건수는 약 1만5424건으로, 2019년 대비 41%나 늘었다. 일부 안치시설은 최대 170구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연말연시나 겨울 성수기에는 제휴 업체의 시설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포화 상태다.
사고가 반복되자 업계는 기술적 대응에 나섰다. 알파클럽 무사시노는 2023년 QR코드와 무선태그(RFID)를 활용한 시신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관이 예정보다 일찍 운반되면 경고등이 울리는 시스템으로 변경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티아 역시 같은 해 QR코드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사고가 난 제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시스템이 도입된 장례식장과 그렇지 않은 곳 간의 관리 격차가 뚜렷한 셈이다.
문제는 일본에는 시신 관리에 대한 공적 기준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현행 법은 사망 후 24시간 이내 화장·매장을 금지하고 있을 뿐, 시신 위생이나 보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장례업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도 없고, 관련 업계 단체에 가입한 업체는 일부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장례업체 운영을 허가제로 관리하고 있고, 한국도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요코타 연구원은 “고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례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해 사고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조만간 시신을 다루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신 위생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