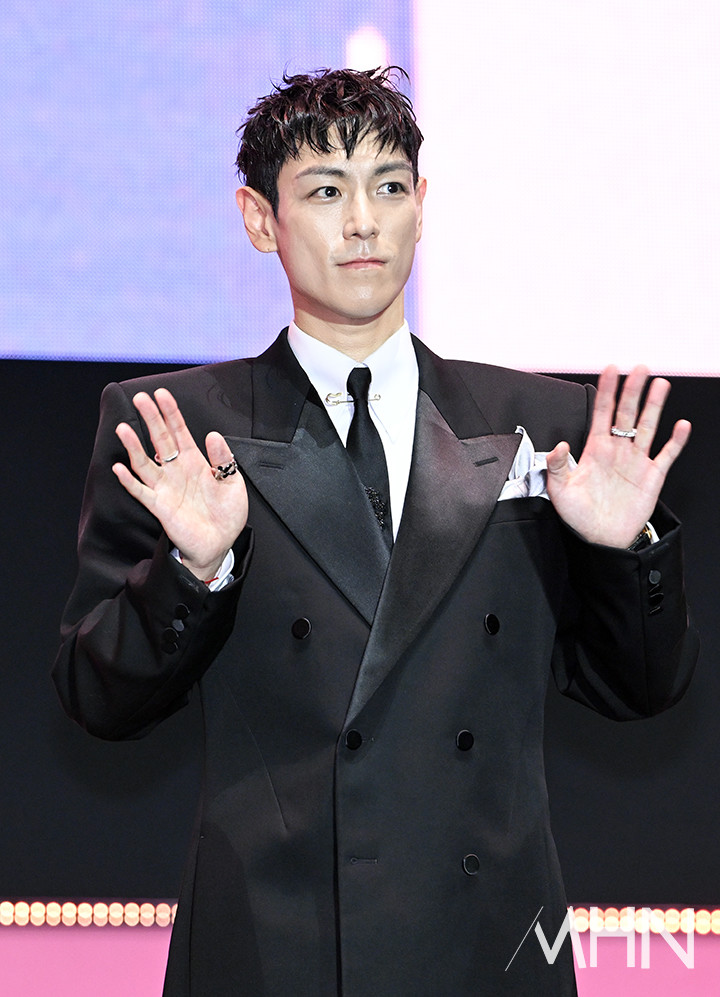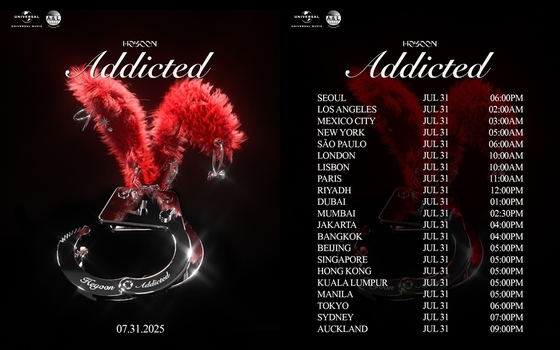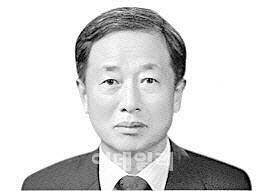
반대로 차악의 시책은 백성을 옭아매고 규제해 시키는 대로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최악은 세금을 무겁게 내려 백성에게 짐을 지우는 행동이라고 적고 있다. 가혹한 과세로 백성을 괴롭히며 나라가 흥한 예는 지금까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사마천의 말마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빚을 과하게 짊어진 국가·기업·개인은 다 망해갔다.
각자 능력에 따라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야 농업·공업·상업이 자연스럽게 분업구조를 이뤄내고 생산이 활발해진다. 백성이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하도록 유도해야 쌀과 소금, 목재 같은 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다. 저소득계층 지원은 생산물시장에서 생산에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1차 분배 이후 소득 지원 같은 제2차 분배를 통해야 한다. 선의의 경쟁을 이끄는 시장 기능을 보호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크든 작든 간에 시장 개입은 어쩔 수 없이 성장동력을 잠식하게 마련이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 할 시장을 억지로 잡아당기거나 멋대로 억누르려는 발상은 시장을 아예 망쳐버린다. 사마천은 연못이 깊으면 물고기가 살고 산이 깊어야 짐승이 서식할 수 있듯이 먹고 사는 삶의 여유가 있어야 인의(仁義)의 바탕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왕도 제후도 경제적 동물의 심성을 어쩌지 못하고 재물을 탐하는데 하물며 일반 백성이 선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나무라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이다. 동서고금 역사를 볼 때 국리민복을 위한 길은 먹고 사는데 쪼들리지 않는 항산으로 올곧은 마음 항심을 갖도록 하는 길이다.
사마천은 군자가 부유해지면 덕을 즐겨 펼치지만 소인배가 부강해지면 그 힘을 휘두르려고만 한다며 마음을 닦지 못한 인간에게 재물이나 권력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경고했다. 엉터리 인사를 요직에 앉히면 유능한 인재가 자리를 뺏겨 나라가 허약해진다는 경고다. 말로만 애국을 외치다 보면 인심은 슬그머니 흩어지고 편 가르기가 횡행하기 마련이어서 소시민은 정신적 굶주림에 시달려야 한다. 사람들의 삶을 위정자 뜻대로 통제하는 포퓰리즘, 독재정치가 초단기에는 몰라도 중장기로는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치를 이미 기원전에 설파한 셈이다.
사마천은 백성의 눈과 귀를 억지로 가리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따라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나라가 편해진다고 했다. “1년만 머무를 곳이라면 곡식을 심고 10년 머무를 곳에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살 곳이라면 덕을 베풀어 인재를 키우라”고 했다. 공동체가 성숙하게 발전할 때 사람의 품격도 높아지고 재물의 가치도 늘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갖은 욕망과 갈등을 조화시키는 고대의 대서사시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귀감이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제적 동물의 심성과 경제적 동기는 변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