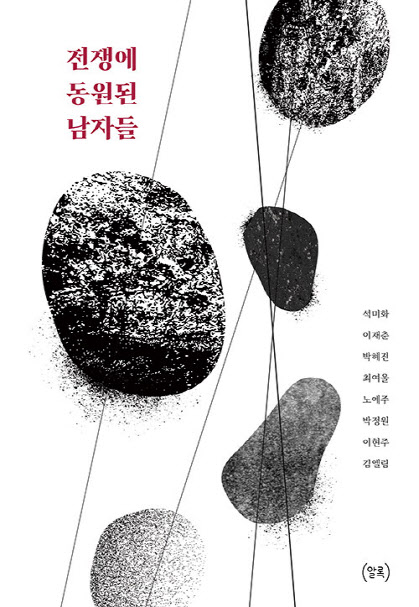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처럼 헬스장 산업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이데일리가 만난 종사자들의 현실은 달랐다. 한 체육관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고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를 간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월세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체육관 대표가 근무를 시작한 이후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떄문이다. A씨는 “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며 “일할 사람이 없다면서 (대표가) 사정사정해서 왔지만 지금은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남양시의 한 필라테스 업체도 최근 임금 체불 논란에 휘말렸다. 적게는 50만원에 많게는 400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강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차 필라테스 강사인 윤모씨는 “큰 규모의 사업장인 데다가 강사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일하러 온 건데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 “첫 달은 주지 않다가 다음 달은 주겠다고 하면서 희망고문 식으로 운영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육계 시장이 좁다 보니 피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체육계에 몸담은 사람의 소개를 받고 업체를 옮기는 데다 계약해지도 쉬운 구조기 때문이다. 윤씨는 “센터에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하루아침 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파리 목숨이라 월급이 조금 밀린 걸로는 항의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는 탓에 제도적으로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정해진 시간마다 출퇴근을 할 경우 드물게 노동자성을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업체 사장들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조차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프리랜서 개인이 지급명령 소송이나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지만 지난한 과정이기에 포기하기 일쑤다.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데다 금액이 십만원대에서 백만원대에 머무르다 보니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기에도 힘들다는 것이다.
프리랜서가 보다 간단하게 구제받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했다고 신고할 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조사해 처리해주게끔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제도를 프리랜서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현준 한국플랫폼 노동공제회 센터장은 “현재 관공서에서 법률 지원을 일부 하고 있지만, 홍보도 되지 않고 예산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조정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프리랜서도 법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행정적인 제도가 있으면 구제가 용이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