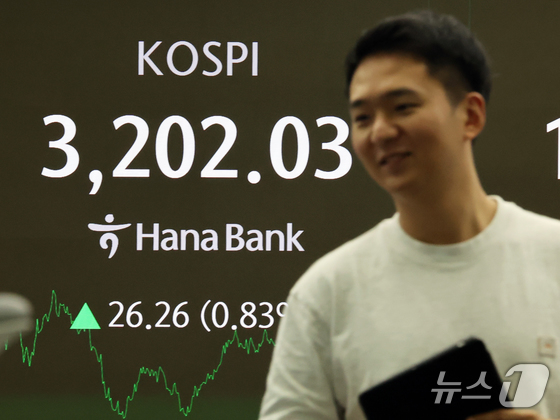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특히 직원 1~2명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에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도 직원보다 적은 금액을 손에 쥐는 이들이 드물지 않다. 사장이자 노동자인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이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으로 기능하는 기현상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월 198만 1440원)이 상한액(198만원)을 넘어서는 초유의 현상까지 벌어졌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의 80%로 결정되는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 탓에 이제는 이 기준으로 지급해도 상한선을 넘기는 탓에 내년부터는 모든 실업급여 수령자들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작지 않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폐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매년 갈아치우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 사상 최대다. 이들중 상당수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유럽 1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오르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대입하면, 2.9% 인상으로 약 12만개 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4인 사업체 수는 538만 6553개다. 이는 전체 623만 8580개 사업체 중 약 8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여야 할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현실은 시급 462원이었던 1988년 첫 시행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최저임금 제도가 만들어낸 결과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일 뿐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생산성과 부가가치, 영업이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그러나 수십년째 모든 업종과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불 능력 반영,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동자 생산성과 사업주 지불 능력에 맞게 임금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높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더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인 동시에 경제 시스템 안에서 작동해야 하는 현실 제도다.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피해자는 고용자도, 피고용자도 아닌 우리 모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