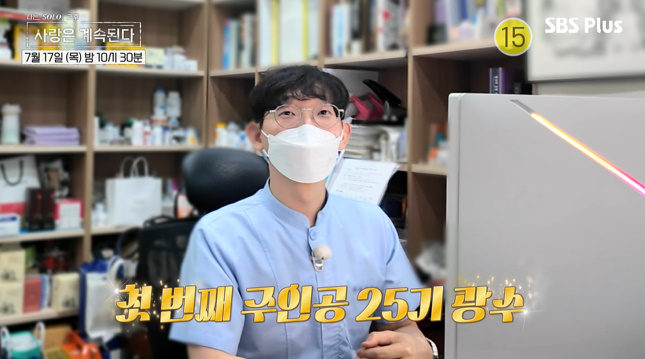6월 28일 영국 런던 그리니치 왕립자치구 내 그리니치 천문대 모습. 런던 시내가 모두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기후·환경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여러 지역 전문가와 소통할 때가 많다. 연구자나 정치인, 사업가까지 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목표는 '탄소 저감'이다.
그러다 보면 보도유예(엠바고)가 설정될 때가 많다. 이 모든 시간의 기준은 영국 런던에서 시작한다. 그리니치 천문대의 본초자오선이 그 기준이다.
런던 남동쪽 언덕 위에 위치한 그리니치 천문대는 제국 시절 세계 항로와 시간을 재던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는 수탈과 정복의 기준점만이 아닌,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시간 기준이기도 했다.
본초자오선은 지구 경도 0도선이다. 위성항법시스템(GPS)도, 위성도, 국제 보도자료의 엠바고 시간도 모두 이 선을 기준으로 삼는다. 오랜 기간 항해사들이 별을 보며 바다를 건넜던 기준,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간 기준이 됐다.
영국의 그리니치 표준시(GMT)는 시대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됐다.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영국이 GMT 시간대를 유지하는 대신 중부유럽표준시(CET)로 이동하면, 겨울철 에너지 소비가 줄어 연간 약 17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러 논의 끝에 현재는 통신과 항공, 기상 등 과학 분야에서는 GMT가 아닌 원자시계 기반의 협정세계시(UTC)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과 아프리카는 UTC+0, 즉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등 동아시아는 UTC+9를 쓰고 있다.

한 모녀가 영국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 안의 '본초자오선'(경도 0도) 위를 걸어가고 있다. (Visitgreenwich) © 뉴스1
기후위기는 시차 없는 문제다. 영국이 밤일 때 한국은 낮이고, 한국이 폭염에 신음할 때 미국은 극한 강수가 퍼붓지만, 모두 같은 지구 시간 안에서 연결된 일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세계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들이 생산하는 기후 데이터는 모든 좌표에 '시간'이라는 축을 붙인다. 온도가 언제 올랐는지, 탄소가 언제 배출됐는지, 바다가 언제 식었는지. 모든 변화의 기록은 그리니치 시간을 기준으로 정리된다.
관측은 중요하다. 기후 변화도 정확한 시간과 장소 기록 없이는 진단조차 불가능하다. 그리니치 천문대가 과거 별과 태양을 관측해 세계 시간을 통일했던 것처럼, 지금은 기후위기 속 변화를 기록하는 전 세계 대응 시간 기준을 세우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좌표 없이는 대응도, 협약도, 정책도 실행할 수 없다.
기후위기는 '몇 도나 올랐는가'보다 '언제까지 늦출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년, 탄소중립 목표의 2050년도 결국 시간 싸움이다. 늦출수록 대응 비용이 급증하고, 피해 규모가 커진다. 그래서 모든 기후 정책 보고서에는 목표 달성 시점과 이행 계획이 명확히 담긴다.
한국도 같은 시간 안에 있다. 한국이 보고서를 발표할 때도 기준 시점을 삼는 것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세 도입과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 전환, 어떤 것도 각자도생으로 할 수 없다. 전 지구적 기준과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만 한다.
그리니치는 한때 제국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관광 명소로 남았다. 그러나 기준선의 의미는 여전하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바뀌지 않듯, 기후 대응의 기준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목표 시점을 늦추는 것은 지구의 시간과 어긋나는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은 과학과 협력이다. 본초자오선 위에 서서 세계를 누비던 영국처럼, 지금의 우리는 과학과 협력을 기준으로 지구의 시간 안에서 대응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와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넥스트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황덕현 경제부 기후환경전문기자 © 뉴스1
ace@news1.kr